
‘방장산의 늙은이’ 혹은 ‘방장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방장노자(方丈老子)’나 ‘방장산인(方丈山人)’이라는 호에는 지리산에 대한 조식의 사랑이 가득 묻어 있다.
이 산은 “남다른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산”이라고 해서 지리산(智異山), “백두산이 흘러내려 이루어진 산”이라고 해서 두류산(頭流山),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이라고 해서 방장산(方丈山)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그런데 조식은 이 산의 여러 가지 호칭 중 방장산을 취해 자신의 호로 삼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식은 당대의 성리학자들이 금기시했던 『장자』를 빌어 자신의 삶과 철학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 때문에 그는 ‘성리학의 정통에서 벗어났다’거나 ‘이단이다’ 심지어 ‘노장(老莊)에 병들었다’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대붕의 기상을 품은 산림의 처사답게 조식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칼날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옥국관(玉局觀 : 도교 사원 혹은 하늘나라)’이라는 도가(道家)의 용어를 빌어 세상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구속할 수 없음을 당당하게 밝혔다.
“고상한 심회(心懷) 천 척(尺)이나 되어 걸기 어려운데 / 방장산 정상 높은 장대에 걸어볼까? / 옥국관에 모름지기 삼생(三生)의 명부(名簿) 있으니 / 다른 해에 이름자를 직접 볼 수 있겠지.” 『남명집』 ‘두류산에서 짓다(頭流作)’
이렇듯 평생 지리산을 벗해 살았던 조식의 삶은 그가 1558년 나이 58세 때 여러 선비들과 함께 이 산을 유람하고 적은 ‘두류산 유람록(遊頭流錄)’에 자세히 나와 있다.
“여러 사람들이 내가 두류산에 자주 출입해 산간(山間)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람록을 기록하도록 했다. 내가 일찍이 이 산을 왕래해 덕산동(德山洞)에 세 번 들어갔고, 청학동(靑鶴洞)과 신응동(神凝洞)에 세 번 들어갔으며, 용유동(龍遊洞)에 세 번 들어갔고, 백운동(白雲洞)에 한 번 들어갔으며, 장항동(獐項洞)에 한 번 들어갔다.
어찌 다만 산수(山水)만 탐해 왕래하기를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겠는가? 백년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 오직 화산(華山)의 한 쪽 귀퉁이를 빌려 늙어 죽음을 맞을 땅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이 마음과 다르게 어긋나서 거처를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이리저리 돌아보고 헤아려 염려하며 눈물을 흘리고 나왔다. 이와 같이 한 것이 열 번이었다. 지금은 매달린 바가지 마냥 시골집에서 나뒹구는 하나의 시체가 되어버렸다. 이번 걸음은 또한 다시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는가?
일찍이 내가 시(詩)를 지었다. ‘죽은 소의 갈비뼈 모양 같은 두류산을 열 번 가량 주파(走破)했지만 / 차가운 까치집 같은 가수(嘉樹) 마을에 세 번이나 거처했네.’
또한 이런 시도 지었다. ‘몸을 보전하려는 백 가지 계책 모두 그르쳤으니 / 지금 이미 방장산과 한 맹세 어기고 말았구나.’
이번 산행을 함께 한 여러 사람들이 모두 벼슬을 잃은 사람이니 어찌 단지 이 몸만 쓸쓸하게 돌아갈 곳이 없겠는가? 다만 술에 취한 사람처럼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길을 잡아 부봉(副封)할 따름이다.” 『남명집』 ‘두류산 유람록’

그러나 지리산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그는 천왕봉(天王峯)을 더욱 가까이에서 대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 미련 없이 계부당과 뇌룡사를 떠나 덕산으로 거처를 옮긴 다음 산천재(山天齋)라고 이름붙인 집을 짓고 살았다. 이 해가 1561년(명종 16년)으로 그의 나이 61세 때였다.
당시 조식은 늦은 나이에도 덕산으로 이사한 이유를 한 편의 시로 읊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옮겨왔지만 맑은 물만 먹고 살아도 충분하다’는 시구(詩句)를 읽고 있자면 조식의 기상과 기백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봄 산 어느 곳인들 향기로운 풀 없으랴만 / 단지 상제(上帝) 사는 하늘나라 가까운 천왕봉을 사랑하기 때문이네 /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 은하수 같은 십리 맑은 물만 마시고 살아도 충분하네.” 『남명집』 ‘덕산(德山)에 복거(卜居)하면서’
또한 ‘덕산 계곡 정자의 기둥에 쓰다’라는 제목의 시에서는 ‘천 석이나 되는 큰 종(千石鐘)’처럼 거대한 울림을 남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허공의 온갖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지리산(두류산)처럼 세상의 온갖 잡소리에도 끄덕하지 않은 의연한 마음을 간직하고 싶은 뜻을 토로하기도 했다.
“천석(千石)이나 되는 큰 종을 보게나 / 큰 것으로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네 / 어떻게 하면 두류산과 같이 /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을 수 있지?” 『남명집』 ‘덕산 계곡 정자의 기둥에 쓰다(題德山溪亭柱)’
그 후 조정에서 숱하게 벼슬을 제수하고 한양으로 불러 올렸지만 조식은 산림처사(山林處士)의 삶을 지키면서 정치 현실에 대한 매서운 비판과 제자들에 대한 강학에만 힘을 쏟았다.
특히 68세 되는 1568년 새로이 즉위한 선조(宣祖)가 조식을 한양으로 부르자 다시 벼슬을 사양하면서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 상소문이 앞서 소개했던 ‘을묘사직소’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조선사 최고의 직언(直言)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무진봉사(戊辰封事)’다.
여기에서 조식은 특히 ‘서리(胥吏)들이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을 갉아먹고 있다’는 이른바 ‘서리망국론(胥吏亡國論)’을 주장하며 이들의 악폐(惡弊)를 제거해 나라를 구하고 민생(民生)을 편안하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라고 임금을 질타했다.
군주의 참다운 덕은 백성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고, 지금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서리들의 악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조식은 ‘구급(救急)’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마치 죽을 위기에 처한 병자(病者)를 다루는 듯 촌각(寸刻)을 다투어 이러한 서리의 악습(惡習)과 폐단(弊端)을 완전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은 새로이 즉위한 임금에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장(老壯)의 처사가 진심을 담고, 거기에다 마지막 희망까지 새겨 보낸 간곡한 충언이었다.

군민(軍民)에 대한 모든 정사와 나라의 기밀과 업무가 모두 서리의 손에서 나옵니다. 관청에 세금으로 바치는 포목이나 곡식도 뒷돈을 더 건네지 않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재물이 모일지는 모르지만 밖으로 민심(民心)은 흩어질 대로 흩어져 열 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각 주현(州縣)을 나누어 가지고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인 양 문서(文書)까지 작성하여 그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헌납(獻納)하는 일체의 것을 가로막고 물리쳐 단 한 가지 물건도 상납(上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물(貢物)을 바쳐왔던 사람들은 온 가족의 재산을 다 팔아 바쳐도 그 재물은 관청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리들의 주머니로 돌아갈 뿐입니다.
게다가 100곱절이 아니면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바칠 수는 없으므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조종(祖宗)의 주현(州縣)과 신민(臣民)이 바치는 재물을 생쥐 같은 서리 놈들이 나누어 가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하께서 다스리는 한 나라의 큰 부(富)가 오히려 서리들의 방납(防納)하는 물건에 의뢰하고 있을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 이런 짓을 하고서도 서리들은 만족하지 않고 왕실 창고에 있는 물건까지도 모두 훔치려고 합니다. 나라에 저축되어 있는 재물이 조금도 없으니 나라는 나라가 아니고 도적들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는 텅 빈 그릇만 끌어안고 뼈만 앙상한 채 서 있으니 조정(朝廷)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목욕재계하고 함께 힘을 합해 이들을 토벌(討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힘이 부족하다면 사방에 호소해서 먹고 잠잘 겨를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임금을 돕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사는 곳에 어떤 좀도둑이 있다면 장수에게 명령해 잡고 죽이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잘것없는 서리들이 도적이 되고 모든 벼슬아치들이 무리를 이루어 나라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혈맥을 갉아먹고 있으니, 그 죄가 신에게 제사지내는 희생물을 훔치는 일에 그치지 않는데도 법관(法官)은 감히 그 죄를 묻지 않을뿐더러 따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관리가 규찰(糾察)하고자 하면 그들의 농간에 의해 견책(譴責)당하거나 파면(罷免)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여러 벼슬아치들은 팔짱을 낀 채 녹봉만 받아먹고 ‘예예’하며 뒷걸음질 칠 뿐입니다. 서리들이 믿는 구석이 없고서야 어찌 이렇게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겠습니까?
초(楚)나라 왕이 이른바 ‘도적놈이 권세가 있어서 제거할 수가 없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삭빠른 토끼가 도망갈 굴을 세 개나 파고 냇가의 조개가 딱딱한 껍질을 방패삼아 몸을 감추듯이 마음 깊숙이 전갈의 독을 품고 온갖 수단을 다해 꾸며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능히 다스리지 못하고 형벌 또한 더할 수 없습니다.
서리들이 이미 도성(都城)과 사직(社稷)에 숨어사는 쥐새끼가 되어버려 불을 피워도 쫓아낼 수가 없고 물을 부어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서리들과 한통속이 되어 토끼가 도망치기 위해 준비한 세 개의 굴이 되어주고, 조개가 몸을 감추는 딱딱한 껍질이 되어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처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하께서 벌컥 화를 내시고 한번 크게 기강을 떨쳐 재상(宰相)들을 불러 모아 그 원인을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 만약 언관(言官)들이 논박(論駁)한 다음에야 마지못해서 쫓아간다면 선악(善惡)의 소재와 시비(是非)의 구분을 알 수 없어서 군주의 도리를 잃고 말 것입니다. 어찌 군주가 그 도리를 잃고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임금의 밝은 덕이 이미 밝으면 마음이 거울처럼 밝아지게 되어 비추지 않는 물건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덕(德)과 위엄을 더하게 되면 풀과 나무도 모두 쏠리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신하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분주히 임금의 명령을 받들 것인데, 어찌 간사한 꾀가 한 치라도 용납이 되겠습니까? 정사를 어지럽히는 대부(大夫)에게는 오히려 일정한 형벌이 있어서 저 윤원형(尹元衡)과 같은 권신(權臣)도 조정에서 바로잡아 처벌했는데, 하물며 여우나 쥐새끼 같은 이런 서리들의 허리와 목을 베는 일 따위야 도끼에 기름을 바르기에도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레가 울리고 비가 한 번 몰아치면 하늘과 땅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이것은 위로 임금이 몸을 닦으면 아래로 나라가 다스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간신(奸臣)들은 자신의 뜻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제거하면서도 간악한 서리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것은 용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일신(一身)을 위하는 것이지 나라를 위한 일은 아닙니다.
신은 홀로 깊은 산골에서 살며 굽어보고 우러러 보아 나라의 형세와 백성의 고통을 살펴보고 탄식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 오늘 전하께서 밝게 보았는가 아니면 어둡게 보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정치가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살펴주십시오. 삼가 소(疏)를 올립니다.” 『남명집』 ‘무진봉사(戊辰封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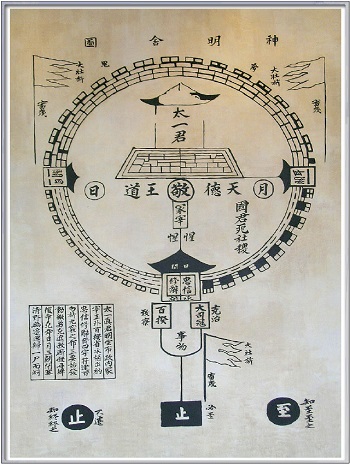
그런데 조식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평소 차고 다녔던 칼과 방울은 어떤 제자가 물려받았을까? ‘의(義 : 의로움)’을 상징하는 칼은 내암(萊菴) 정인홍이 물려받았고 ‘경(敬 : 공경함 혹은 두려워함)’을 상징하는 방울은 동강(東岡) 김우옹이 물려받았다.
특히 정인홍은 스승의 유지를 이은 ‘강우학파’의 맹주 대접을 받았는데, 그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광해군이 즉위한 후 권력을 잡은 북인(北人) 대북파(大北派)의 정신적 스승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서인(西人)들에 의해 ‘역적의 수괴’라는 혐의와 누명을 쓴 채 비참한 죽임을 맞게 된다.
그런데 정인홍의 죽음과 더불어 조식의 학맥 또한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조식의 문하생은 곧 대북파이고, 대북파는 곧 역적이라는 등식이 조정(朝廷)과 사림(士林)을 휘감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황이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유학자로 찬사를 받는 동안 조식은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