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깐부치킨이 적접한 절차 없이 대표의 말 한마디로 간부급 직원 3명을 해고하고 이에 반발해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직원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중 한 간부는 이번이 세 번째 해고였다.
10일 깐부치킨과 해고자 및 지인들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깐부 치킨의 박모 전무와 설모 본부장, 장모 부장은 김승일 대표로부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깐부치킨은 해고자 본인들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설명은 물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
해고자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경 해고 통보에 앞서 밤 10시 경 부장단 회의를 소집한 김승일 대표는 분위기가 쇄신 차원에서 일괄사표를 종용했다.
이튿날 일괄사표는 백지화됐지만 김 대표는 다시 부장단과의 회의를 소집해 박 전무가 우리 조직에 필요한 인물인지를 물었고 설 본부장과 장 부장은 큰 보탬이 안 된다고 박 전무의 존재감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박 전무는 즉시 해고가 통보됐고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박 전무가 반발하자 설 본부장과 장 부장도 함께 해고됐다.
설 본부장은 해고 당시 위로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설 본부장의 해고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였다. 대표의 말 한마디에 입사와 해고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던 것이다.
반면 최근 깐부치킨의 속칭 ‘구더기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한 장본인인 장 부장은 퇴사 당일 김 대표로부터 ‘그 건은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과 함께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
장 부장의 급여는 월 700만원이었다. 올해 초 월 급여 500만원으로 깐부치킨에 입사한 J부장은 능력을 인정받아 두 달 만에 200만원이 인상된 700만원으로 올랐다.
이들은 7월 말 해고 이후 김 대표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만나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장 부장은 포천 공사판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가계를 꾸리다 최근 고용노동부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장 부장의 구제신청으로 깐부치킨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김 대표의 친구인 경영회계본부 김모 고문으로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가 온 것이다.
김 고문은 장 부장과의 통화에서 “김 대표한테 설명해서 일을 잘 마무리 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장 부장이 조금 양보하지 그래? 좋게 끝나도록 할 테니까 조금 양보하자”며 위로금 1000만원을 제안했다.
또한 “깐부에 있었던 부분의 나머지 부족한 날짜만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며 인사서류상에서 퇴사일을 조정해 줄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조건은 합의서와 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소였다.
이와 관련 깐부치킨 경영회계본무 김모 고문은 10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당사자들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금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기자와 만나 “장 부장과의 전화통화는 공식적인 차원이 아니다”면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고문은 퇴사일을 조정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 역시 “달래는 차원에서 했던 말로 오버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부장과의 통화 이외에 이들 3명의 해고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언급을 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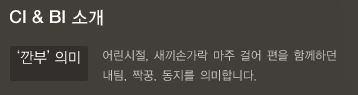
한편 깐부치킨의 ‘깐부’는 “어린 시절 새끼손가락 마주 걸어 편을 함께 하던 내 팀, 짝꿍, 동지를 의미한다”고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