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아생전 이름깨나 날렸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이름값을 치러야 했다.
유산과 이권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다툼은 범인들의 죽음 앞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경우에는 무덤이 파헤쳐지는가 하면 시신이 도둑맞고, 불태워지고, 박제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부관참시를 비롯해 연구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왕릉들이 파헤쳐졌던 사례는 대표적이다.
또한 1990년대 롯데그룹·한화그룹·태광그룹의 선친 묘소가 금전을 노리는 도굴꾼들에 의해 피해를 당했던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비단 국내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더했다.
하이든의 두개골은 그의 음악적 능력을 골상학으로 분석해보겠다는 무리에 의해 도굴당한 후 100년이 넘도록 제 몸을 만나지 못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시신은 본인의 뜻에 따라 화장됐지만 천재의 뇌는 연구를 빌미로 부검의에게 강탈당했고 수십 년간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녔다.
절도로부터 유해를 지키기 위해 링컨의 관은 최소한 16차례나 옮겨 다녀야 했고 지친 가족은 그의 관을 지하 3미터의 납골당에 넣고 그 위에 1.8톤의 시멘트를 붓게 했다.
혁명가이자 정치가였던 레닌은 죽은 후 소박하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 곁에 묻히길 원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그의 시신을 영원히 썩지 않는 미라로 만들어 정치적 선전물로 모스크바 광장에서 전시했다.
파시스트 정권의 몰락과 함께 처형돼 광장에 던져진 무솔리니의 시신도 반파시스트들의 공격을 피해 수도원의 벽장에 11년간이나 숨겨둬야 했다.
이처럼 시신을 소유하고 만지고 보고 전시함으로써 유명 인사와 연결되고 싶다는 욕망의 역사는 깊다.
신간 『무덤의 수난사』(뮤진트리)는 모차르트에서 히틀러까지 역사적 인물들이 죽고 나서 겪어야 했던 기상천외하고 오싹한 모험을 그들의 삶과 연결해 살펴본다.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죽음에 대한 문화적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도 추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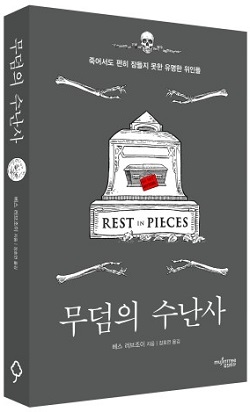
이 책에서 소개되는 이야기들은 역사적 인물들이 살았던, 그리고 매장됐던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다. 남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시신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통해 그 시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죽음과 애도의 방식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알게 된다.
예컨대 예전 사람들에게 죽음은 지금보다 더 친숙하고 성스러운 것이었다. 유명한 두개골을 곁에 두거나 죽은 친구의 머리카락으로 반지를 만들어 끼고 다니는 것이 그리 괴상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저자 베스 러브조이는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때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면서 “이 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려 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거울 보듯 똑바로 보게 한다는 점에서 정신과의사들이 하는 노출치료와도 같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