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사롭게만 다가오던 봄볕이 어느새 한낮에는 더위를 느끼게 한다. ‘봄볕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엔 딸을 내보낸다’는 옛말처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노화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이맘때쯤 옛 사람들은 가까운 이들에게 건네줄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부채다. 24절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동지에 새해달력을 선물했다면 ‘태양의 축제’로 일컬어지는 단오 절기에는 부채가 가장 유용한 선물이었던 셈이다.
부채는 더위를 피하는 수단이자 동시에 멋을 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특히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의 손에 들린 부채의 고리나 자루에는 ‘선초’라는 장식품이 매달려 미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도 했다.
또한 학구열이 강한 이들은 부채에 배운 것들을 써서 들고 다니며 외우기도 했고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 늘 몸에 지니며 보고 싶을 때마다 부채를 펼쳐보기도 했다.
전라북도 전주에는 조선시대 임금님에게 진상될 만큼 품질이 좋은 부채를 만드는 선자청이 있다. 그곳을 지키며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김동식 장인(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은 전통부채을 만드는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선자장’이다.
신간 『무형문화재를 만나다』(북코리아)는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무형문화재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책이다.
무형문화재 공연장과 전시장을 돌며 익숙한 판소리부터 생소한 바디장 공예까지 우리 무형유산에 대한 개념과 역사 등을 장인의 목소리로, 때로는 현장의 전문가나 전승자의 이야기로 전해준다.
무형유산이라고 해서 일상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다. 이름은 낯설지언정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접하고 있는 ‘우리의 것’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예를 들어 부채와 관련해 쉽게 떠올리는 전통문화는 판소리다. 두루마기에 합죽선을 들고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춰 사설을 읊어나가는 창자의 모습은 우리 민족 고유의 멋을 느끼게 한다.
판소리는 영화 『서편제』를 통해 비교적 대중에게 친숙하다. 이후에도 판소리를 주제로 한 영화와 뮤지컬 등이 이어졌고 해외 축제와 행사에까지 초대돼 한국적 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그러나 판소리에 대해 설명하자면 말문이 막힌다.
‘판’은 큰 마당을 뜻하는 말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즉 열려 있는 넓은 공간을 말한다. ‘판’이라는 공간에 ‘소리’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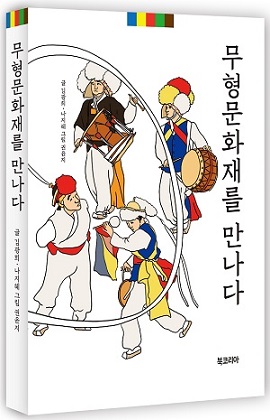
판소리는 조선 중기 이후 남도지방 특유의 곡조를 토대로 발달했으며 전승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간에 조금씩 다른 특성에 따라 계보를 형성하는데 이를 ‘제’라 부른다. 즉 전라도 동북쪽은 동편제, 전라도 서남쪽은 서편제, 경기도와 충청도는 중고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책은 어렵고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 무예, 음식, 공예 등 8가지 분야의 전통문화 100여종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저자인 김광희 한국문화재재단 공연기획팀장은 “현재를 만든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의 접합점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면서 “이 책은 그 뿌리를 이해하는 첫걸음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한다.


